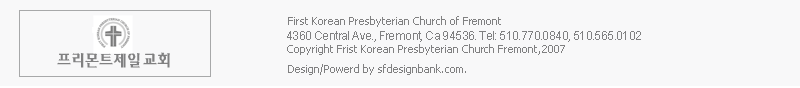토요일 오후, 신촌의 작은 소극장에서 상영 중인 『사랑의 침묵』 이라는 영화를 만나러 갔다.
잠시 일상이라는 호흡을 뚝, 멈추고 잠잠히 침묵하면서 주님과 만나는 특별한 경건시간이었다. 영화는 영국의 노팅힐에 있는 봉쇄수도원도인 가르멜 수녀원에서 성주간 즈음부터 부활까지 수도자들의 일상과 기도생활이 촬영된 다큐멘터리이다. 침묵하는 수도자들의 일상은 날마다 분주하고 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손짓한다. 따뜻하나 철저히 단절된 세상이라는 소란함이 사라진 그곳을 만나는 순간, 정과 욕심이 비껴간 냉정함과 철저함이 보인다. 그래서 더 따뜻하게 보인다. 따스한 성령님이 절제된 깊은 내면에 순결하게 드러난다. 깔깔깔, 활짝 웃어도 격이 있고, 신나는 춤을 추고 풀을 베고 억척스럽게 나무 톱질을 해도 그녀들은 순결했다.
말이 필요 없는 일상으로 카메라를 따라 들어가면, 어느 새 수도원의 일원이 되어 일하고 기도하고 침묵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 영화는 수도자가 봐야 하는 특수한 영화가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감동해야 마땅하고 어쩌면 불신자들까지라도 해당되는 깊이 있는 울림의 메시지가 있다. 영화의 포스터에는 이렇게 써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소리 없는 울림
소리 없는 울림
마이클 화이트 감독은 영국 런던 노팅힐 한가운데 있는 ‘가르멜 여자 봉쇄 수도원’ 맞은편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수도원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끌려 수도원 측에 다큐 촬영을 제안했다. 10년을 기다려 마침내 촬영과 인터뷰 허가를 받았고, 하루 두 차례 휴식시간 외에는 1년 내내 종일 침묵을 지키는 수도자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일상이 담겼고, 하나님과 믿음에 대한 문답이 오간다. 카메라는 수도원과 수녀님들을 함께 담으면서 날카롭게 혹은 경의(敬意)를 표하는 관객이 된다.
“주님이 당신의 소리를 안 들어줄 때가 있지 않느냐?” “죽음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게 아니냐?” 등 하나님과 믿음, 삶과 죽음에 대한 직설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한 단단하고도 깊은 대답은 긴 침묵에 대한 보상처럼 보는 이의 마음에 울림과 깨달음을 준다.
느릿한 화면에 침묵은 입체감을 불어넣는다. 긴 줄로 늘어선 기도시간, 성전을 비추는 빛에 비추인 그녀들의 검은 수도복은 한폭의 무채색 그림이다.
“수도원에 들어온 것이 혹 도피는 아니냐?”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간다. 그게 도피다.”라고 답한다.
TV나 스마트 폰이나 핸드폰, 게임, 그 외에 사람들과 대화하느라 무언가를 주고받느라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 얼굴을 돌리는 우리들이 현실로부터 도망을 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들의 말(입)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조바심쟁이가 되어 버렸다. 어서어서 말을 해야 시원하고 초조하지 않다. 답답하지 않다. 오래 참지 못한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혹은 정죄하기도 하고, 때론 살인을 하기도 한다. 그래야 시원하다. 무서운 일이다.
그만, 말하라고 알려주는 영화 속 장엄한 소리는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종소리다. 땡그렁, 말을 멈추라. 땡그렁. 기도하러 가라. 땡그렁. 주님과 대화할 시간이다.
삶과 죽음
믿음과 삶, 죽음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은 모든 인간의 화두다. 경험이나 상상, 지식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후에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 마음에 남는다.
『모든 삶은 죽음으로 끝나고 모든 날은 잠과 함께 죽는다』는 제라드 맨리 홉킨스의 말을 인용하며 인터뷰하던 어느 수녀님의 미소 속엔 초월이 묻어났다.
기도, 침묵, 노동이 전부인 삶.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갈등과 번민 그리고 기쁨과 희열 속에서 결국 침묵만이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알려준다. 말은 주님과 나누고 그 속에서 답을 얻으라고 얘기해 준다. 믿음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 그분과 깊이 대화하기 위해 입술을 닫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한다.
침묵의 순간과 더불어 수녀원의 소리는 기계소리, 노동하는 소리, 톱질하는 소리. 유리창을 닦고, 모종을 심고, 밀떡을 만들고, 노쇠한 수녀님을 돌보고, 수련복을 재단하고, 악보를 적고, 인터넷 판매를 하기 위해 컴퓨터 자판을 살며시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짧은 인터뷰와 기도문을 외고 찬양을 하는 시간 외에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소리, 종소리, 북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들이 대사를 대신한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없다. 일하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장식 하나 없이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환경에서 단순한 노동을 하며 침묵 가운데 자신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수도자들을 보면 복잡하게 소리 나는 우리들의 생활에 잠시 멀미가 난다.
컴퓨터와 핸드폰, 전화, 만남 등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우리의 속은 잠잠히 침묵하지 못해 시끄럽고 번잡스럽다. 깊이 있게 주님과 나만의 소중한 비밀스런 대화를 하지 못하니 가끔은 성령께서도 탄식하신다. 소리에 민감한 우리는 세상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에도 세밀하게 귀를 기울인다. 그것을 정보, 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듣고 나누고 전달하고 내 것으로 삼는다.
내 것을 취하다가 주님의 것을 잃어버린다. 부질없는 것을 듣고 말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린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하셨다(고전4:14-21).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나누고 즐겨하고 싶은 사람은 입을 벌려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내가 저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가 저것을 갖고 싶다. 저 물건을 소유하고 싶다. 저것, 이것, 그것, 그리고 또 저것, 그리고 이것. 멈출 수 없는 삶의 쳇바퀴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지쳐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것들로 말이다.
잠자는 순간이 곧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하던 수녀님의 말속에 진리가 숨어 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잘 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누리지 않아서 평안히 자는 사람에겐 잠이 달다. 누리고 소유해야 하는 사람의 잠은 고달프다. 삶과 죽음의 이치도 이와 같다.
하나님의 침묵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는가?”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 소설가의 『침묵』에 질문의 답이 나온다.
일본으로 파송된 로드리고라는 한 신부님은 어려움이 닥치고 성도들이 하나씩 죽어갈 때마다 ‘하나님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진다. 그러나 아무 응답도 들을 수 없었다. 그의 배교 여부가 일본 신자들의 목숨을 결정하기에 하나님이 아닌 고문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바꾼다. 배교를 상징하는 성화 밟기를 할 때 그는 배교자들이 밟고 간 십자가 위의 일그러진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밟히고 밟히고 또 밟혀서 그 얼굴조차 알아보기 힘든 얼굴을 바라봤을 때 그는 깨닫는다. 여태 침묵했던 하나님이 그 위에서 조용히 함께 고통 받고 계셨음을.
가끔 하나님도 침묵하신다. 악인들이 승리하는 세상을 향해. 이제 그만 무엇인가를 보여주길 원하는 간절한 나의 외침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아무도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니 침묵하실 수밖에 없다. 죄로 인해 눈앞이 보이지 않는 인간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들. 침묵하실 수밖에 없다. 때와 시간을 모른체 떼쟁이들처럼 어서 주세요. 외치는 소리에 침묵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주님은 오늘도 침묵하며 말씀하신다.
정결한 회개의 자리에서 너와 만나고 싶구나. 속히 내가 가서 죄악 세상을 심판하고 참 진리를 선포하는 순간을 위해 기다리며 기도해 주지 않겠니. 네 주님. 대답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에 거룩한 기쁨의 십자가가 세워짐이 보이지 않는가.
이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