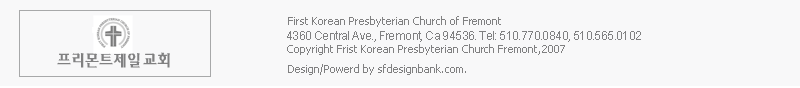참으로 오랜만의 산행이다. 그래봐야 교회 뒤 나지막한 산이지만 2분 뒤 바로 산길을 걸을 수 있음은 참 감사한 일이다. 이따금씩 대화를 주고받으며 천천히 오르는 산행은 여러 일로 긴장했던 심신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준다.
일부러 발을 굴러본다. 그럴 때마다 쿵쿵 느껴지는 땅의 울림이 정겹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함께 음악이 된다. 현의 스침이 있고, 목관을 통과하는 부드러운 소리가 있다. 숲속의 실내악이다.
자주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을 떠올리며, 호흡처럼 수도 없이 ‘주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한다. 그러다 문득 놀라고 만다. 왜 ‘사랑합니다.’는 호흡이 될 수 없는가, 왜 종종 그 거룩한 고백은 잊어버리는 것인가, 아직도 그 사랑은 멀리 있는가, 아니면 무언가가 그 사랑을 잊게 하는가.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바위에 오르자 순백의 햇살이 눈부시다. 맑은 하늘엔 솔개가 높이 떠 빙빙 먹이를 찾고 있다. 두려움 때문인지 이름 모를 산새 한 마리가 낮은 가지 위를 총총거리며 오간다. 두 손을 이으면 닿을만한 거리에서 나를 힐끔 쳐다보곤 재빨리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린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새 형제여!” 손바닥을 펼쳐 뻗으며 프랜시스 성자의 흉내를 내어본다. 왠지 어설프다. 새도 황당했던지 갑자기 배설을 하고는 다른 가지로 날아가 버린다.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지만 새 형제의 자유가 좋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그래 맘껏 하나님을 찬양하렴. 그걸로 족해.’
정상의 바위에 앉아 위기 속의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잠시 회개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했다. 좀 더 자주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 30분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산이 가까이 있어 다시 감사하다.
주님이 오르신 겟세마네 동산도 이 정도였을까. 올리브 산에서 붙들려 성전을 향해 내려가셨던 예수님의 무거운 발걸음을 느낄 수 있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은 훨씬 더 깊고 자연스러우리라.
형편이 좋고 기분이 좋아 드리는 감사 고백보다 더 귀한 고백은 바로 그것이다. 모든 것을 예수님과 일치시키며 드리는 사랑과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실패 속에서 겟세마네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와 피 같은 땀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거듭 잠든 제자들에게 와서 기도에 동참해 달라 하셨던 주님의 그 절박함을 느낄 수 있다면. ‘오 주님! 사랑합니다.’는 호흡이 되리라. 그리고 그 사랑의 호흡은 우리를 더 주님 가까이로 이끌리라.
약간 무겁게 느껴졌던 마음도, 다리도 내려오는 길에 더 감사로 바뀌었다. 주님의 아픔 속에 나의 아픔이 있고, 주님의 고독 속에 나의 고독이 있으며, 주님의 영광 속에 나의 영광이 있기에 더 바랄 것 없는 행복한 사랑이다.
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