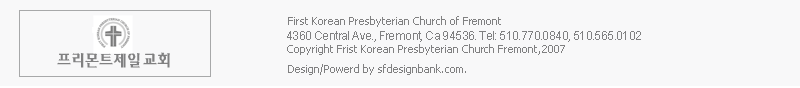친구가 되어 주세요
얼마 전부터 4살배기 남자 아이가 주일학교에 왔다. 아이의 엄마는 베트남분이시고, 아빠는 한국분이시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 한 탓인지 행동이 매우 거칠다. 뛰어다니면서 물건을 함부로 만지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깨물고 괴성을 지르고 침을 뱉고 아무데서나 소변을 본다. 그 또래 남자 아이들에게 훤히 나타나는 자기방어의 한 행동이려니 하지만, 좀 지나치다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와 잘 놀아 주지도 않고 함께 있는 것을 꺼려했다. 이리저리 뒹굴고 바인더 문을 확 열고 후다닥 달려오는 통에 주일학교 예배도 엉망이 되어버리곤 했다. 부드럽게 타일러도 보고 꾸중도 해보지만 별 소용이 없다.
대예배시간에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게 마음을 느슨하게 놓고 있을 수가 없다. 잠시라도 눈을 떼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가 잠깐 보이지 않아 교육관을 가보니 정수기 밑바닥이 물로 흥건하다. 걸레로 물을 닦고 있는데, 식사 준비를 하시던 한 분이 “전도사님, 이제 아이 보모노릇까지 해야겠네요.” 하신다. 순간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다. ‘아니 내가 보모노릇 하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나?’
이것저것 서툰 것이 많지만, 아이의 밑을 닦아주는 것도 그리 쉽지만은 않다. ‘아, 내게는 너무 어려운 시험 문제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 속으로 아우성을 쳤지만 그럴수록 마음만 더 산란하고 괴로웠다. 분명히 내가 안고 가야할 일인데, 귀찮은 생각이 먼저 들었다. 아이들에게는 귀엽고 사랑스런 다니엘보다는 그 아이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것이 하늘에 상급이 더 많다고 했지만, 정작 나도 불편하고 귀찮은 마음이 들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만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면서 몇 주 전에 본 한 분의 삶이 그려진 영상이 떠올랐다.
전쟁의 폐허 속에 가난과 병과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 준 수단의 슈바이처 고 이태석 사제이다. 특히 그분은 아이들의 가슴에 ‘사랑’과 ‘희생’이라는 두 글자를 깊이 새겨놓으셨다. 의사자격증을 따고 사제가 된 후 혈혈단신으로 아프리카 수단으로 건너갔다. 두 배를 움켜쥐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즐비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군과 민간단체 군인들과 이곳저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 마치 무정부상태와 같은 상황이었다. 그곳에서 그분은 쉴 틈도 없이 환자들을 돌보았다. 밤늦게 먼 거리에서 온 환자들이 있으면 싫은 기색 한 번 하지 않고 치료를 해 주었다. 희망을 안고 온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 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자신은 비록 피곤해도 그분은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치료로 그들의 피곤과 고통을 싸매어 주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수단의 유일한 브라스 밴드를 만들었다. 손발이 뭉그러진 한센병 환자들에게는 일일이 발모양의 본을 떠서 신발을 만들어 주었다.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학교도 보내주었다. 그는 수단의 뙤약볕을 가릴 변변한 옷도 없었지만, 결핵환자나 각종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한 백신을 보호할 아이스박스를 준비하는 데는 자신의 물질과 몸을 아끼지 않았다.
처음으로 거리에 브라스 밴드의 악기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을까? 한 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그곳에 희망의 전주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구멍 난 스타킹, 아무렇게나 걷어 올린 바지, 다 닳아버린 슬리퍼 등 아이들의 행색은 보잘 것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너무나 밝았고, 그분의 가르침이 아이들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서로를 사랑하고 따로 떨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하셨어요. 인격이 훌륭하면 어떻게 연주를 하든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너무 몸을 아끼지 않고 혹사한 탓일까? 결국 그분은 말기 대장암으로 짧은 생애를 살다 가셨지만, 아이들의 심령에 십자가의 사랑을 언어뿐만 아닌 몸으로 가르치셨다. 또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척박한 수단의 땅에 희망의 씨앗이 될 더 많은 희생의 밀알들을 불러들였다. 하지만 내 모습은 어떠한가? 그다지 튼튼하지 않은 육체를 핑계 삼으며 조금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엄살을 피우고 있었다.
어느 주일에는 그 아이가 베개를 들고 교회까지 달려왔다. 아빠가 잠든 틈에 문을 열고 도로를 건너 아침에 교회까지 달려온 것이었다. 반가움과 놀라움이 순간 교차되었다. 한편으로는 ‘아이가 그래도 교회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되면서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는 수단의 아이들의 아버지요 친구였던 그분의 글귀가 떠올랐다. “처음에는 워낙 가난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같이 있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있어 주고 싶다.”
그 아이가 온 후로부터는 4살 아이가 갖고 놀게 무엇일까 찾고, 사고, 여쭈어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였다. 밥을 먹을 때 손으로 집어 먹고, 혼자서 먹으려고 고집을 피우는 탓에 앞치마 하나를 한 사모님에게 얻었다. 그러나 정작 그 아이는 지금 함께 놀아주고 함께 있어 줄 친구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따뜻한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난 아직 그리 마음이 넓지도 따뜻하지도 않다. 눈높이도 잘 맞추지 못하고 엉거주춤 아이를 대할 때가 많다. 어떻게 하면 조금 수월하게 아이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심술쟁이 계모다. 더구나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거나 바람이 불어도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가시들이 흔들거리며 퉁명스러운 말과 표정으로 푹푹 찔러 댄다.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이 강한 우레와 뇌성처럼 들려지는 것은 왜 일까?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의 속 좁은 마음은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다. 왠지 그 아이로 인해 나의 평화로움이 깨어지고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았다. 아, 언제쯤 희생하기 싫어하고 손해 보기 싫어하는 이 모든 단단한 이기적인 가시를 다 뽑아낼 수 있을까? 어쩜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과 희생을 가르치기 위해 그 아이를 보낸 것이 아닐까?
이번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갈지 주님이 물끄러미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다. 어쩜 나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이론과 공식이 아닌 인내와 희생과 섬김을 배우는 사랑의 학교에 갓 입학을 한 코흘리개 아이임에 틀림없다. 언제쯤 풋내기 새엄마 딱지를 떼려는지. 아직은 끙끙거리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지만,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도 그 아이의 마음에도 사랑의 오선지가 그려지리라. 다음 주일에는 환한 미소로 아이를 꼭 안아주어야겠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15:13-14).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