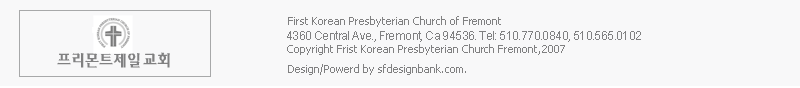겨우내 떠났던 새들이 돌아왔다. 톡톡 튀는 동작과 어우러져 지저귐이 맑고 경쾌하다. 겨울의 위로처럼 물오른 가지에서 화단 밭으로, 또 다른 가지로 튀어가며 인사를 한다. 반가움을 참지 못한 몸짓에 뒷산으로 냉큼 날아 가버렸다. 잠시 뒤에 또 올 것이니 서운하지 않다. 이제 봄이 아닌가. 시끄러운 까치도 왔지 않은가.
목발을 짚고 있는 아내 시중을 들다 며칠 만에 올라온 정원엔 봄꽃들의 향연이 벌써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대견하다. 지난 겨울이 그리 추워 염려했던 가지들의 새순은 더 파랗다. 흩뿌린 퇴비의 냄새가 구수하다. 시골 윗목에 띄운 메주를 생각나게 한다.
지나가지 않는 것이 있던가. 추위도 외로움도 아픔도 지나가고 새봄이 오듯 새날이 기쁨 속에 시작된다. 은총 아닌 것이 있던가. 고민도 고통도 방황도 참혹한 실패도 다 성숙을 위함인데. 삭풍에 찢긴 저 앙상한 가지들을 보라. 그들이 꽃 피우고 있지 않은가. 더 굵어졌지 않았는가.
매일 날이 가고 달이 간다. 다 지나간다. 요는 새로워지는 것이다. 매해 새롭게 피는 것이다. 가는 것을 서러워할 건 없다. 나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가는 일이 두려워선 안 된다. 주님 은총 속에 새로워질 앞을 본다면 아무것도 서운할 것은 없다. 더 새롭게 될 것이니까. 더 높이 자랄 것이니까. 더 깊이 숙성될 것이니까. 그러다보면 저렇게 다시 돌아와 재회를 기뻐하는 노래도 더 맑은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떠나보내자. 나이를 떠나보내고, 사람도 떠나보내고, 가족도 떠나보내자. 간다한들 주님 품속에 안기니 떠난다고 떠난 것이 아니다. 다 그 안에 있다. 종종 그 안 한 구석에 있는 내가 주님보다 더 커져서 주님 밖으로 나가기에 문제가 생길 뿐이다. 그러니 무언가 떠날 때 잃어버린 것 같은 불안이 왜 안 생길까. 누군가 사라질 때 서운함이 왜 안 일까.
다 주님 은혜 안에 있는데 왜 그 안에 있는 내가 불안해야 하는가. 내 안에 사는 또 다른 나 때문인가. 주님 안에 있는 나와 그를 찾지 못한 까닭인가.
잘라진 나무 등걸 옆으로 새순이 힘차게 머리를 든다. 얼어버린 가지 밑에서 싱싱한 줄기가 올라온다. 동식물은 좌절이 없다. 서운함도 없다. 은혜를 받아들인 오늘과 그 은혜를 노래할 내일만 있다.
봄을 보라. 그분이 아닌 것이 어디 있는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롬1:20).
정말 봄이다. 계절의 여왕이 온다. 그녀도 창조주의 은총을 노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환희로 맞을 다정한 이들을 기대한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롬8:19).
봄 안에 살자. 뜨거운 여름엔 또 여름에 살자. 가을엔 봄 여름의 풍성한 결실 속에, 추운 겨울엔 추위로 더 찬란할 봄을 기대하며.
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