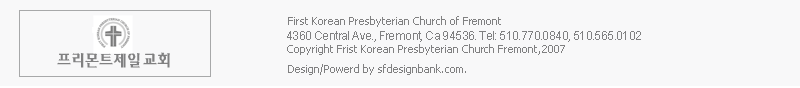이것을 오솔길이라 해도 되는 지 알 수 없지만, 제가 매일 걷는 길 중에 소박한 오솔길이 있습니다. 전세금이 비싸 교회에서 좀 떨어진 군포역 쪽으로 이사를 한 다음 날 발견한, 기찻길 옆 담 밑으로 이어진 그 길은 1km도 채 안 되는 차도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길 같지도 않은 길입니다. 그래도 큰 나무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풀잎 사이로 다져진 호젓한 길입니다.
저는 새벽이건 밤이건, 어느 때는 자전거로 어느 때는 도보로 이 길을 걷습니다. 교회까지 30분 정도의 거리 중간에 있는 이 작은 길은 제게 산속에서 만난 옹달샘과도 같습니다. 그늘이 드리워진 이 길로 들어서면 마치 어린 시절 숨바꼭질 하는 기분이 듭니다. 안에서 밖은 잘 보이지만 도로에서 이 길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작은 길이 구불거리고, 한 걸음에 오를 수 있는 아주 작은 언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기차 소리가 날 때면 양평 할머니 댁으로 가 던 중 걸었던 철로길이 생각납니다. 철로 길은 여간 정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사라져가는 침목들, 기차가 지나간 자국에 손을 대면 따뜻했던 철로의 평행선, 철길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이면 이어지는 부드러운 산길들, 그리고 두둥실 떠올랐던 파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
그래서 제겐 이 길은 추억과 꿈이 함께 걷는 길입니다. 베토벤이 “전원 교향곡”의 영감을 얻으며 걸었던 호수길이 되고, 괴테가 숙고하며 걸었던 숲길도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좋은 건 언젠가 한없이 걷게 될 갈릴리 바닷가의 꿈이 익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쓰기 위해 몇 달 전에 걸었던 그 길은 너무 분주했습니다. 흥분과 감동이 있었지만, 시간도 거리도 도무지 여유가 없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오리라고 다짐하고 주님께 간청했었습니다. 교인들이 다 함께 올 수 있다면 좋겠다고, 불치병으로 시한부의 삶을 사는 윤중이네도 함께 올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런데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오솔길 속에서 다시 그 감동이 일어납니다. 아, 어쩌면 장소의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흔적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면 어디든 님과 가는 길이 됩니다. 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다면 예루살렘도 사진 찍을 장소나 찾는 관광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감옥도 주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되었고, 피가 튀던 콜로세움은 천국의 계단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셨던 법정은 지옥의 입구가 되었고, 거룩한 골고다는 비웃음과 조롱의 현장이 되었나 봅니다.
“이 작은 우리 집에서는 화장실이 제일 넓어 좋아요.”라며 웃던 아내와 밤 기도가 끝나면 함께 걷거나, 자전거에 태워 집으로 옵니다. 그러곤 밤에는 너무 어두워 걸을 수 없는 그 길을 알려줍니다.
“저기가 바로 제가 말하던 그 오솔길이에요.”
“어, 그래요? 나도 언제 그 길을 걸어봐야지~.”
박상태